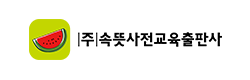2025. 9. 18(목) 한자와 명언 焉烏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뜻사전관련링크
본문
2025. 9. 18(목)
한자와 명언(2204)
焉 烏
*어찌 언(火-11, 3급)
*까마귀 오(火-10, 3급)
배움과 수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마치 매일 거울을
보며 자기 모습을 가다듬는 것처럼, 내면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뜻이 담긴 명언을 찾아보다. 먼저, ‘焉烏’린 한자어를 조심조심 살펴본 다음에!
焉자는 ‘언조’(焉鳥)라는 새를 이름짓기
위해서 그 모양을 본뜬 것이었다. 후에 ‘어찌’ ‘이에’라는 뜻으로 활용되는 예가 많았고, 본뜻으로 쓰이는 예는 거의 없다.
烏자는 ‘까마귀’(crow)를 뜻하기 위해서 鳥(새 조)에서
눈동자를 가리키는 점(丶)을 생략한 것이다. 까마귀는 온 몸이 새까맣기 때문에
까만 눈동자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아이디어가 참으로 기발하다.
焉烏는 ‘서로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한자’를 이른다. 너무나 흡사하여 오인하기 쉬운 것은 ‘焉烏’ 말고 ‘午牛’도 마찬가지다.
맨 앞에서 말한 명언을 아래에 옮겨 본다. 공자 제자 증자의 말을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다소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여,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분발한다.”
日省其身,
有則改之,
無則加勉.
-‘四書集注’
● 필자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추신] 끊임 없는 자기 성찰로 큰 인물이 된 사례를 삼국지에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제미나이)이 아래와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
삼국지에서 "내면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간"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오나라의 명장 여몽(呂蒙) 입니다.
무장에서 지장으로, 괄목상대(刮目相對)의 주인공
여몽의 이야기는 '日省其身, 有則改之, 無則加勉'의 정신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1) 초기의 여몽 (有則改之 이전)
처음의 여몽은 용맹하고 싸움은 잘했지만, 오직 무예에만 치중할 뿐 학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오하아몽(吳下阿蒙)', 즉 '오나라에 있는 미련한 아몽'이라고 부르며 그의 무식함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고쳐야 할 분명한 '허물(則)'이었습니다.
(2) 손권의 조언과 여몽의 변화 (有則改之 실천)
오나라의 군주 손권(孫權)은 여몽의 재능을 아껴 그에게
장차 큰일을 맡기려면 학문과 병법을 깊이 공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여몽은 이 말을 깊이 새겨듣고, 바쁜 군중 생활 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수많은 병법서와 역사서를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고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3) 괄목상대(刮目相對)의 탄생 (無則加勉의 경지)
몇 년 후, 오나라의 대도독이었던 노숙(魯肅)이 여몽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전의 무식한 여몽으로만 생각했던 노숙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정세를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에 깜짝 놀랍니다.
노숙이 "이제 예전의 오하아몽이 아니구나!"라며 감탄하자, 여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비란 사흘을 떨어져 있다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士別三日,
卽更刮目相待)." 여기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의
괄목상대(刮目相對) 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여몽은 단순히 단점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지략과 통찰을 갖춘 명장으로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이는 '허물이 없으면 더욱 힘쓴다(無則加勉)'는 경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몽은 자신의 부족함(무학)이라는 허물을
인정하고(日省其身), 배움으로 이를 채웠으며(有則改之),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지략가로 발전해 나감(無則加勉)으로써
관우를 사로잡는 등 오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발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