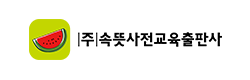2025. 9. 11(목) 한자와 명언 檢疫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속뜻사전관련링크
본문
2025. 9. 11(목)
한자와 명언(2199)
檢 疫
*검사할 검(木-17, 5급)
*돌림병 역(疒-9, 3급)
입을 잘못 놀렸다가, 또는 입으로 잘못 삼켰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동서고금을 통하여 무수히 많다. 이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자. 먼저 ‘그 배는 입항하자 바로 검역을 받았다’의
‘檢疫’에 대해 차근차근 훑어본 다음에!
檢자는 ‘(나무) 봉함’(seal)을 뜻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나무 목’(木)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僉(다 첨)이 발음요소임은 儉(검소할 검)
劍(칼 검)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문서를 넣은 봉투에 검인을 하는 오랜 관습과 관련이 있다.
후에 ‘단속하다’(supervise) ‘법’(rule)을 뜻하는 것으로 확대 사용됐다.
疫자는 유행성 급성 전염병의 통칭, 즉 ‘돌림병’(infectious disease)을
뜻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병들어 누울 역’(疒)이 의미요소로 쓰였다.
이 경우의 殳(창 수)는 役(부릴 역)을 줄여 쓴 것으로 발음요소 역할을 한다는 설이 있다.
檢疫(검:역)은 ‘돌림병[疫]의 유무를 검사(檢査)하고 소독하는 일’을 이른다.
소독(消毒)은 ‘해로운 균[毒]을 약품, 열, 빛 따위로 죽여 없애는[消]는 일’을 이른다.
입을 조심해야 하는 까닭을 옛 선현은 이렇게 갈파했다.
입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을 경계하고, 늘
신중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명언이다. 말이 간결하여 외우기도 좋다.
“병균은 입을 통해 들어가고,
우환은 입을 통해 생겨난다.”
病從口入, 병종구입
患自口出. 환자구출
- ‘意林’
● 필자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추신] 인공지능(제미나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낭패본 사실을 삼국지연의에서 찾아달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뜻의 '환자구출(患自口出)'의 가장 극명한 사례로
삼국지연의의 양수(楊修)의 죽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재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언행으로 인해 결국 조조에게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1) 양수, 조조의 의중을 간파하다
양수는 조조의 참모로,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조조의
속마음을 매번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자신의 의도를 너무 쉽게 간파당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과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양수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은 결국 조조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계륵(鷄肋)' 사건입니다. 유비와의 한중(漢中) 전투에서
조조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진격하자니 승산이 없고,
물러나자니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간 암호로 '계륵'을 내렸는데,
부하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양수는 '계륵'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닭갈비'는 먹을 것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부위이므로, 조조가 한중 땅을 두고 "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계속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곧 회군할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양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부하들에게 짐을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양수가 자신의 속마음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것에 크게 분노하여 양수를 참수하라고 명령합니다.
(2) 말이 불러온 비극
양수의 죽음은 단순히 '계륵'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조조의
후계자 문제(조비와 조식의 경쟁)에 깊이 개입하는 등 수많은 언행으로
조조의 경계심을 극에 달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과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수의 사례는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과 정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자신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교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환자구출'의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